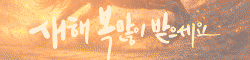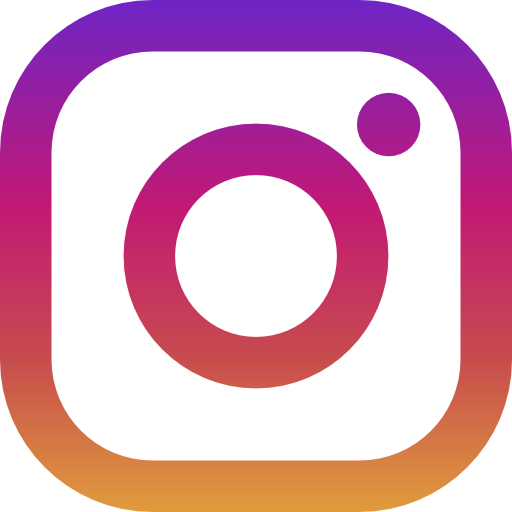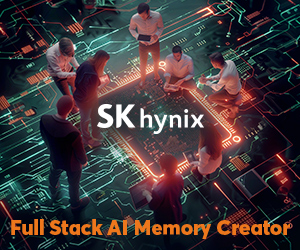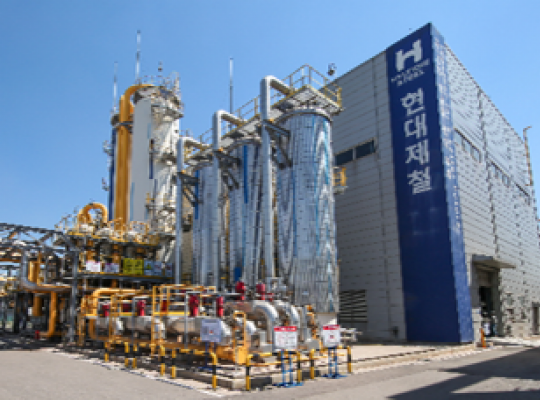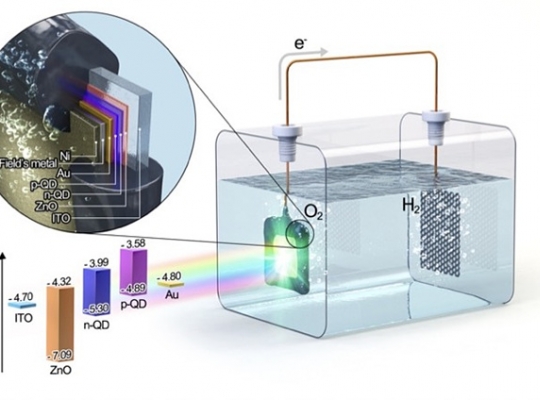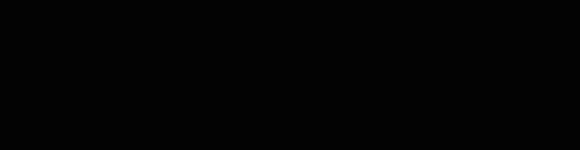기후취약국들이 "기후위기는 생존 문제"라며 선진국의 실질적 감축과 재정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자메이카, 쿠바, 모리셔스 등 기후취약국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다. 이들은 "기후위기가 국가 존립을 뒤흔들고 있다"며 선진국의 미흡한 감축 이행과 느긋한 지원에 대해 비판 발언을 연달아 쏟아냈다. 자메이카 대표는 "우리는 협상의 문구를 다듬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왔다"고 말하며 선진국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이들의 절규는 최근 카리브해 섬나라들을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멜리사(Melissa)'의 영향도 컸다. 시속 298km에 달하는 괴물 허리케인으로 인해 이 지역 나라들은 주택과 도로뿐 아니라 병원과 전력망 등 사회 인프라도 붕괴됐다. 이는 '복구 가능한 피해' 수준을 넘어 사회 기반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었다. 취약국들은 "이제는 기후재난이 경제·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단계에 도달했다"며 즉각적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선진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지나치게 낮아 지구 평균기온을 약 2.5℃ 상승 경로로 고착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제시한 1.5℃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기후취약국들은 "1.5℃ 목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선"이라며 목표 상향을 요구했다.
재정 지원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했다. 선진국들이 낸 기후대응 자금과 손실 및 피해 재원이 기후취약국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카리브해 섬나라 국가들은 "약속은 계속되지만 실제 받은 자금은 매우 적다"며 선진국의 책임있는 이행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COP30을 계기로 기후취약국들의 메시지가 기존의 지원 요청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구조적 책임을 압박하는 '생존 담론'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절박한 요구가 선진국 감축 목표와 기후금융 개편 논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