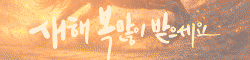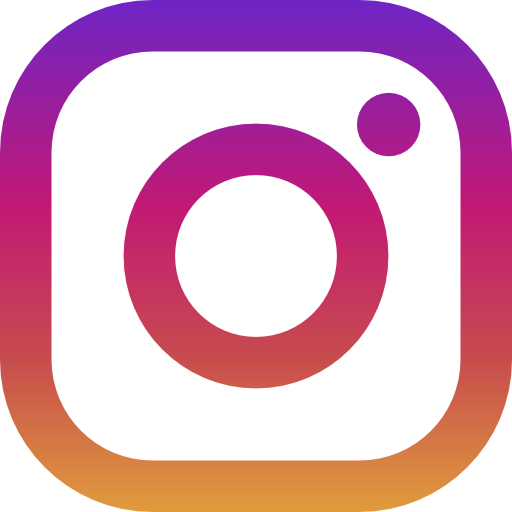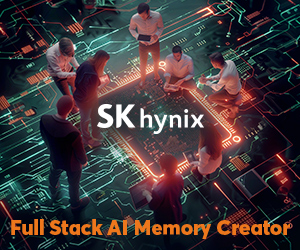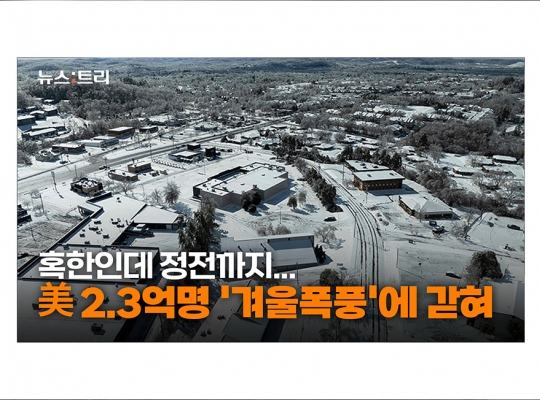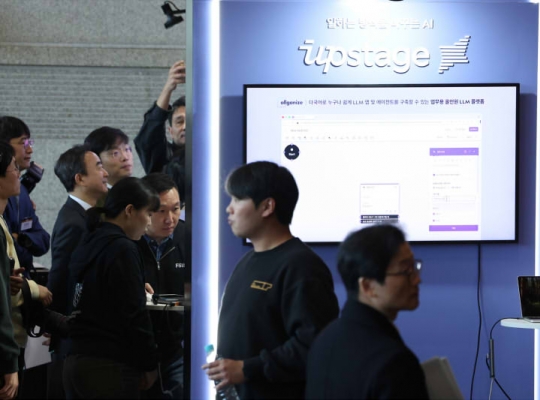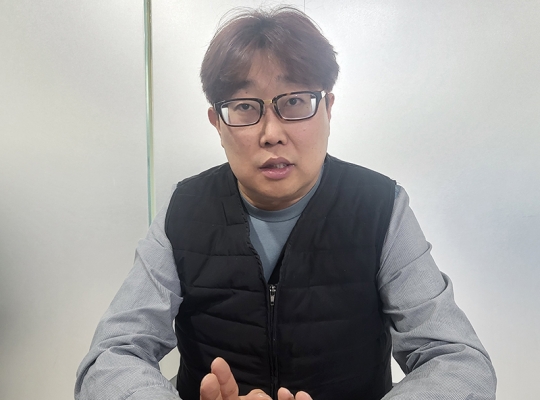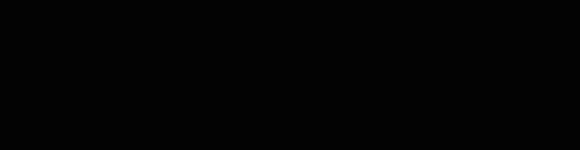지난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UN Plastics Treaty)이 결렬된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후속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합의를 위해 만장일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유엔환경계획(UNEP)은 향후 일정을 추후 발표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7차 유엔환경총회(UNEA-7)가 주목받고 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UNEA-7이 협상 재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한 협약이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협상 교착의 근본 원인으로 만장일치 방식을 지목하고 있다. 여타의 다른 협약처럼 다수결 방식이었다면 거듭 결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유엔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마지막 총회인 5차 회의에서 성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협상이 결렬됐고, 올 8월에도 또 결렬됐던 것이 '만장일치' 방식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제네바 협상 결렬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린피스는 일부 석유화학 산업 이해관계국의 반대가 합의를 가로막았다며 유감을 나타냈고, 세계자연기금(WWF)은 절충 없는 약한 협약보다는 강력한 협약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상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일부 국가는 독자적 연대나 지역 협약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럽연합과 미국 일부 주에서 선제적으로 강제 규제를 도입한다면, 국제 협상 틀 밖에서 변화가 먼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중국이 최근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lifecycle) 규제' 도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플라스틱 생산량 제한에 소극적이던 중국이 태도를 바꾸면서 다자 협상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협상에서 전 생애주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환경부 장관은 올 연말까지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종식이라는 공동과제 앞에서 다시 합의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지, 오는 12월 열리는 UNEA-7이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