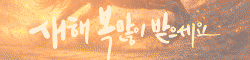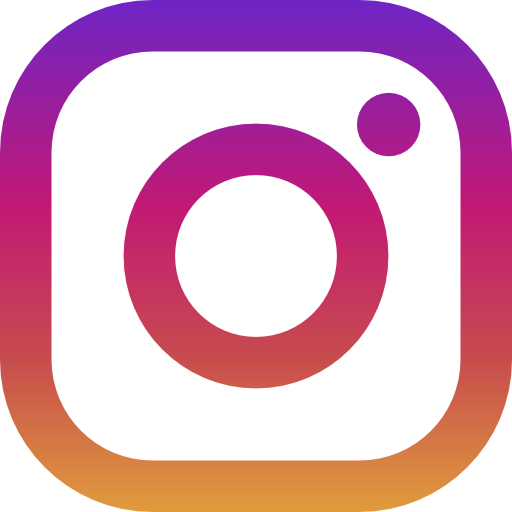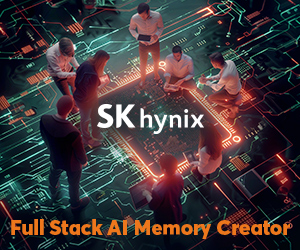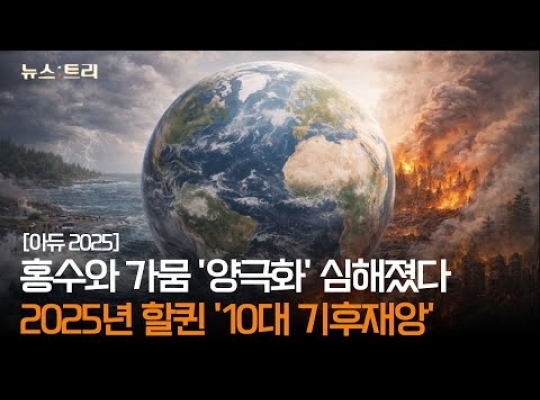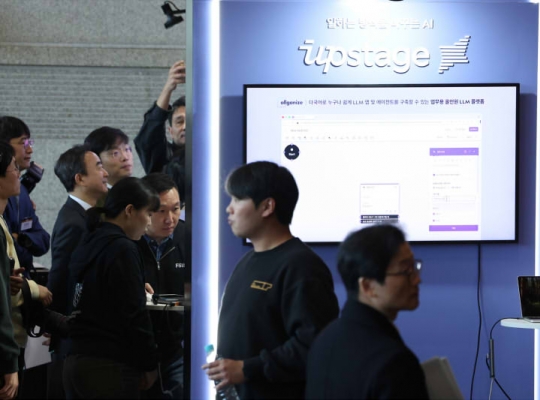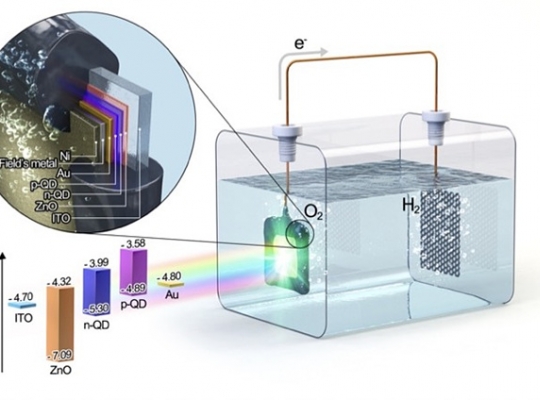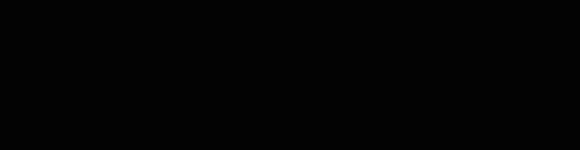폐지 예정인 국내 석탄발전소가 여전히 초과보상을 받고 있으며, 그 세수가 약 53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10일 '석탄발전 과잉보상 실태와 해결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전력시장 구조가 이미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모두 회수한 석탄발전소에 과도한 보상을 제공해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한국전력공사 부채는 120조원을 넘어서며 2020년 대비 2배로 증가했다. 이는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연료비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의 연료비를 그대로 보전해주는 '총괄원가보상제'가 2001년 시행 이후 계속 유지돼온 탓이다.
총괄원가보상제는 한전 자회사(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 등)가 운영하는 발전소와 한전간의 정산금 조정을 통해 원가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위험없는 이윤'을 보장해주면서 화력발전 기반 전력산업을 유지하는 보루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분석에 의하면, 2024년 기준 한전 자회사가 소유한 총 53개 석탄발전기 가운데 36기가 이미 투자비와 적정이윤(WACC 4%)을 모두 회수한 상태였다. 이들이 남은 수명인 약 30년간 계속 운영될 경우 적정이윤을 넘는 초과보상 규모가 53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전망이다.
또 초과보상액이 가장 높은 5개의 발전기의 경우 30년 수명 시기까지 모두 보장받으면 수익률이 최대 16%에서 13%까지 달해, 초과보상 수준이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화력발전 과잉보상에 들어가는 재원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며 현 비용기반 전력시장(Cost Based Pool, CBP 시장)을 빠르게 개편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발전소가 실제 전력을 생산하지 않아도 '준비돼 있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용량요금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서 기준용량가격은 10년 새 90% 이상 상승했는데, 그 사이 발전기의 실제 고정비는 오히려 감소해 과도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료비 변동 위험을 발전사가 아닌 한전이 부담하는 현행 전력시장 구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연료비 급등으로 한전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같은 시기 발전자회사는 연료비 상승분을 그대로 보전 받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했다. 기후솔루션은 "이 구조는 한전의 적자를 국민이 부담하는 '보이지 않는 보조금'이며, 탈탄소 전환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잉보상 석탄발전소를 즉시 퇴출하는 것이 2040 탈석탄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화력발전소 초과보상 제도 전면 폐지 △한전 및 민간발전소의 실제 수익률 전수조사 및 총괄원가보상제 폐지 △재생에너지 및 유연성 자원에 대한 보상 확대 △재생에너지, ESS, 가상발전소(VPP) 등 신규 전력자원 재투자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기후솔루션 임장혁 연구원은 "현 전력시장 보상제도는 2001년 이후부터 유지돼온 화력발전 기반 전력산업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주 전원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가상발전소(VPP) 등 전력 신사업에 맞는 새로운 보상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